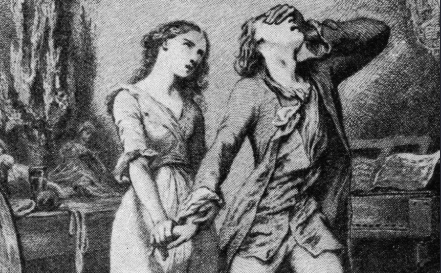젊은 로재씨의 슬픔 - (The Sorrows of Young Rojae, 우당탕탕 PL 데뷔기)
젊은 로재씨의 슬픔
The Sorrows of Young Rojae: 우당탕탕 PL 데뷔기
이 글은 회고이자 고백이며, 반복되는 프로젝트 담당과 책임을 통해 고민하고, 방황하여, 정리된
지금까지의 나의 태도에 대한 기록이자 주장이다.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총괄, 리딩을 해본 적 있나요?”
첫 직장에서의 여정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였다.
돌아보면 부족한 날들이었지만,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달려왔다는 건 자부할 수 있다.
기숙사 생활, 연구단지의 긴 하루, 누구보다 늦은 퇴근.
나는 그 시절 늘 마지막으로 사무실 불을 끄는 사람이었다.
퇴근 이후 풀리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AWS EC2에 서버를 세워 테스트를 하고, 다음 날 회사 출근 이후에 온프레미스를 다시 올려보고, 팀원들과 그 과정을 공유했다.
그 시간들이 내게 기술적 자신감을 안겨줬다.
운 좋게도 정부의 paperless 사업을 맡아 KISA 심사까지 갔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것은 “반쪽 리딩 경험”이었다.
내가 직접 한 것은 인프라/기술적인 총괄이었고,
정작 중요한 일정 조율과 외부 커뮤니케이션은 내 몫이 아니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반쪽짜리” 과거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우당탕탕, 진짜 프로젝트 리딩을 시작하다”
두 번째 직장에서 초반 업무는 단조로웠다.
그래서 팀장님(K님)께 “더 도전적인 과제를 맡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일들이 쏟아졌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인증 프로젝트’ 리딩이었다.
처음엔 막막했으나 새벽에 혼자 재택 작업을 하기도 했고, 주말도 반납했다.
회의에 늦은 날도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해냈다.
오픈은 무사히 마쳤고, 동료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셨다.
“젊은 로재씨의 슬픔”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면 아마 이만큼 배우진 못했을 것이다.
오픈 이틀 전, 기획자 D님과의 커뮤니케이션 누락으로 명세가 통째로 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담당자 K님은 정해진 시간만 일하시고 퇴근하셨다.
같이 해보자던 L님은 결국에 함께하시지 않으셨다.
Spring jpa를 모르시는 분에게 2시간 동안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날 이후에 기억을 못하셨다.
결국 야근은 늘어났고, 화나고. 실망했고, 지쳤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결국 내가 마주한 건
“내가 문제였다”는 깨달음이었다.
리더였다면 이런 구조를 미리 막았어야 했다.
그래서 이후 나는 모든 업무를 문서화하고, 협업 도구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선제적으로 주도했다.
회의도, 설계도 더 이상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았다.
→ 가장 중요한 건 K님(팀장님)께 진행/이슈사항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
물론 아직도 불만이 많고, 나 또한 완벽할 순 없지만…
“그래도, 조금 나아졌나요?”
그렇게 한 번 경험하고 나니, 달라졌다.
예전엔 의견을 조심스럽게 냈던 내가,
이젠 설계부터 일정까지 선제적으로 이끌었다.
회의록을 정리하고, 문서화를 독려하고, 누락된 정보는 채워 넣었다.
그러자 팀 분위기에도 변화가 생겼다.
동료들은 내 노력을 점점 알아보기 시작했고,
업무 관련 의견도 더욱 적극적으로 제안해왔다.
의도치 않게 나의 기준이 팀의 기준처럼 작용하면서,
조금씩 눈치를 보는 분위기도 생겨났다.
물론 그건 내가 압박을 주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최선을 다해 이끌다 보니, 때로는 강해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나는 늘 사람을 먼저 보려 했다.
실수를 탓하기 보다는 이해하려 했고,
가급적이면 일정보다 방향이 맞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다.
나는 완벽한 PL이 되려고 노력했으나, 당연히 그건 쉽지 않았고
그 사이에 겸손하게 하나씩 동료들과 배우며 인간적가 되려 노력했던 것 같다.
그리고 아마 그 진심이 조금씩 전해졌던 것 같다.
그 과정에서, 나는 성장함을 느꼈다.
“어쩌다 성장했을까?”
단 하나, 추진력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료가 실수했을 때, 탓하기보다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이 나를 성장시켰다.
TPS가 아무리 올라가도,
설계와 공유, 장애 대응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건 일시적인 속도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됐다.
나의 작은 성장의 이유는,
결국 철학적인 사유였던게 아닐까
“좋은 관리란 무엇일까?”
관리란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끌어내는 것’인 것 같다.
사람을 이해하고, 각자의 장점을 최적의 구조에 녹이는 작업이다.
때론 리더가 방향을 제시해야 하지만,
때론 옆에서 함께 뛰며 “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결국 관리는 사람 간 신뢰를 설계하는 일이다.
우리 PD분들 성과를 위해서, 내가 팀장님께 어필을 잘 해야지..!
처음엔 흉내 내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나는 프로젝트를 이끄는 담당자이기 때문이다
“리더와 보스는 다르다”
| 보스 | 리더 |
|---|---|
| 위에서 지시한다 | 옆에서 함께 나선다 |
| “이거 해” | “같이 해볼래?” |
| 결과가 안 좋으면 팀원을 탓한다 | 시스템을 돌아본다 |
| 성과로 신뢰를 얻는다 | 신뢰로 성과를 만든다 |
보스 밑에서는 사람이 숨고,
리더 옆에서는 사람이 자란다.
나는 작은 리더였고,
팀장님은 중간 리더였다.
C레벨분들은 큰 리더이신 셈이다.
음.. 그렇다면 우리의 보스는 누구였을까?
“진짜 보스는 누구인가?”
과거엔 부장님, 상무님이 명백한 보스였다.
수직적인 명령 체계 속에서 움직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다니는 회사는 다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문화 속에서
리더는 관리자이자 조율자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
우리의 진짜 보스는 고객이다.
고객의 필요, 고객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진짜 방향이 되기 때문이다.
고객에게 사랑받지 않는 커머스 서비스를 살아남을 수 없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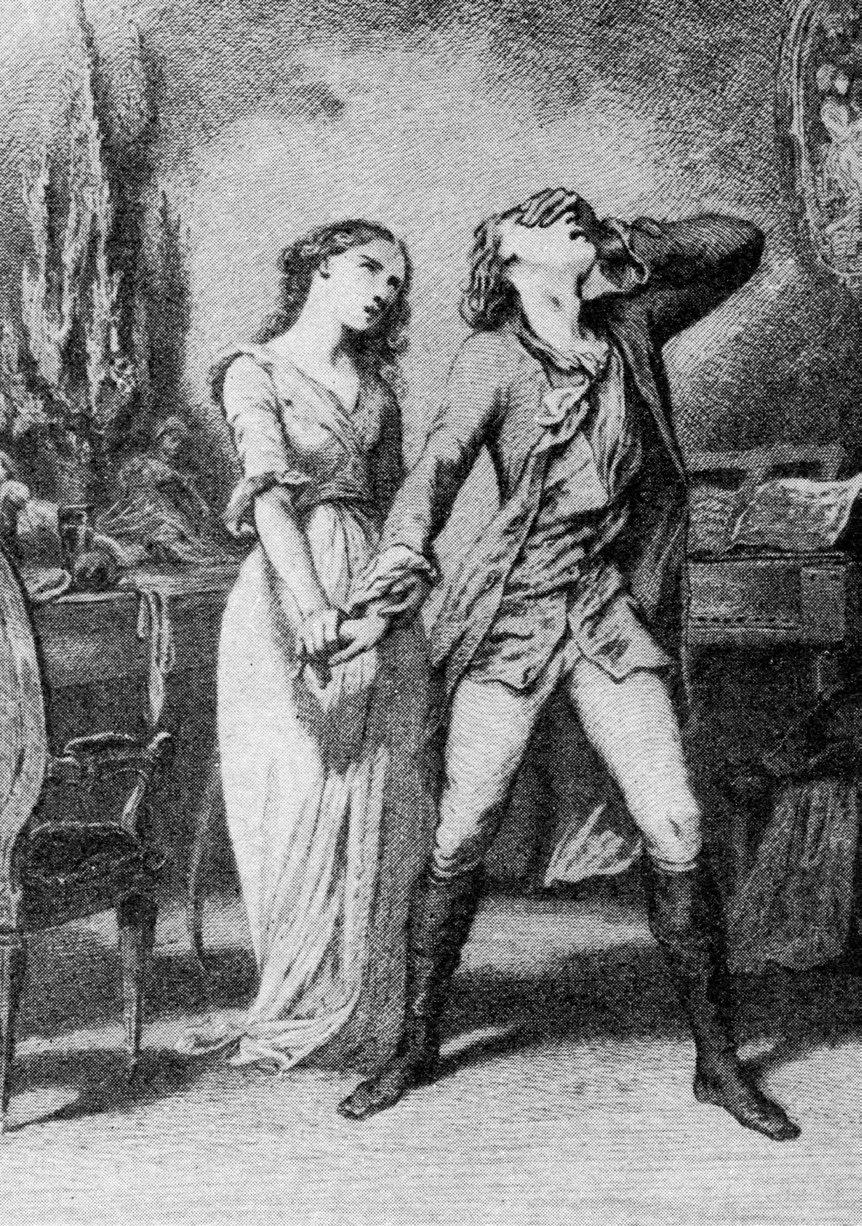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비극으로 끝난다.
베르테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로테을 향한 사랑은 있었지만, 현실은 따라주지 않았다.
나는 갑자기, 이 이야기가 힘이 들때 종종 떠오르곤 했었다.
팀원들의 의지, 현실의 문제, 설계의 한계, 책임의 압박
어떻게 버티고 나아가야 하는가?
“노력하는 한, 우리는 방황할 자격이 있다”
괴테는 말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느니.”
나는 이 말을 믿는다.
방황은 게으름이 아니라, 제대로 하려는 사람만이 겪는 길이다.
“용서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길은 없다.”
동료의 실수를 품고, 다시 함께 걷는 용기가 필요하다.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 행동해야 한다.”
현실을 바꾸는 건 의지가 아니라 실행이다. 의견을 이야기하고 맞는 길로 나아가자.
다만 구성원의 이야기를 반드시 겸손히 경청해야한다.
“자신을 믿는 순간,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된다네.”
나는 로재씨의 의견을 믿고 있다.
믿을 수가 없다면, 믿게 만들어야만 할 것이다.